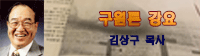[원목 일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페이지 정보
본문

병원의 원목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늘 특별합니다. 동시에,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얇고 깊은 계곡을 오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엔가 저는 단 한 주 동안 죽음을 눈앞에 두었거나 이미 죽음을 맞이한 세 명의 환자 곁에서 영적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올해로 109세가 된 연로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껏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는 80세 남짓으로 보였고, 귀는 많이 어두우셨지만 대화는 또렷이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이불로 반쯤 가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빨리 죽었어야 했어…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아들들도 딸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는 고손녀와 함께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며 담담히, 그러나 깊은 한숨으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녀는 1920년 스페인 독감이 미국을 휩쓸던 시절, 아홉 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대공황과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을 생각하니, “이제는 빨리 죽고 싶다”는 고백이 이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리교 신자였지만, 그날은 저의 기도마저도 조용히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57세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으니 호스피스를 고려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의사는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가 죽음의 전령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단순했습니다. “난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말 뒤에, 그녀의 삶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홉 살에 부모의 이혼, 이어진 성적 학대, 열세 살의 또 다른 가정과의 갈등, 너무 이른 독립. 한때는 결혼으로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만족은 없었고, 폐암을 이겨낸 뒤 이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사랑과 그 사랑의 죽음. 그 후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에이즈를 앓고 있었고, 폐에는 물이 차 있었으며, 간 기능은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반복했습니다. “나는 계속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그녀가 살고 싶어 할 때는 살게 하시고, 정말 떠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을 때에야 데려가 주소서. 삶을 향한 그토록 절박한 열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의료진이 그날따라 유난히 허망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둔, 스물한 살의 젊은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어머니의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을 묻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보인 환자의 몸은 심폐소생술 이후의 처참함 그대로였습니다.어머니는 마치 현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잃고 울다가, 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잊은 듯 다시 딸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말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넋두리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였다고, 심장병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일 것입니다. 그 곁을 지키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목들은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권장받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흘렀습니다.지치도록 살아온 사람, 고통 속에서도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아직 더 살아야 할 딸을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원목의 일상입니다. 그 세 장면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Rev. Don S Shin, MDiv, ThM
Board-Certified Chaplain
C: 630-456-3866
- 이전글[수잔 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 자살률 높이는 조울증의 역사적 배경 26.01.20
- 다음글[이훈구 장로 칼럼]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일어난 사고 26.01.20